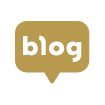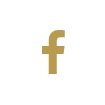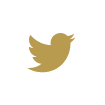대기업 중심의 ‘수입 버거’ 경쟁, 10여년 전 ‘재벌 빵집’보다 더 ‘땅 짚고 헤엄치기’
“성공한 브랜드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국내 수제버거도 좋은 품질이지만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대로 파이브가이즈 강남에서 열린 파이브가이즈 한국 진출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한 말이다.
김 본부장이 언론에 모습을 비춘 건 2015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갤러리아면세점 62프리오픈’ 기자간담회와 2017년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간간히 승마선수 시절 모습과 해외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소격동 일식당을 한다는 소식 등이 들려왔지만, 공식적으로 그가 마이크를 들고 기자들에게 발언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취재진들은 방산과 에너지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라는 대기업이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미국 버거 브랜드를 수입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아울러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를 발굴해 한화의 경영 능력을 발휘해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볼 생각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성공한 브랜드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사는 안국역 근처 매장도 많이 가보고 있는데 다 좋은 품질이지만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로 가져갈 생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 배경에는 현재 파이브가이즈 계약상 유사업종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김 본부장은 오히려 K푸드를 글로벌로 키울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라이벌로 여기는 버거 브랜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경쟁 상대라고 느껴지는 곳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는 강남대로에 매장이 있는 SPC그룹의 ‘쉐이크쉑’과 BHC그룹의 ‘슈퍼두퍼’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런 김 본부장의 파이브가이즈 간담회 발언이 보도된 이후 인터넷 상에는 “재벌 3세로 태어나 한다는 일이 겨우 햄버거 사업 라이선스 따는 거면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닌가”, “한화가 수제버거라…존심도 없나”, “한화가 어떻게 대기업 재벌이 되었는지 스스로 잘 알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지 햄버거 장사를 하나”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일각에서도 김 본부장이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건방져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통 재벌 3세가 기자간담회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파이브가이즈 한국 진출로 인한 김 본부장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은 크다. 한화솔루션에서 독립한 한화갤러리아로 그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경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화갤러리아의 지분 0.25%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미등기 임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도 전략부문장(전무)을 맡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이다.
10여 년 전 ‘재벌 빵집’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빵집’까지 진출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여론이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빵집을 차리고 커피를 판다는 비판 여론이었다.
이후 호텔신라, 롯데, 현대차, 신세계,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던 빵집과 카페가 매각되거나 철수 절차를 밟았다. 한화 역시 에릭케제르(수입 베이커리)와 빈스앤베리스를 하다가 철수하거나 매각했다.
그러나 그때는 국내 자체 커피나 베이커리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아티제를 호텔신라가 아직 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스타벅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수입 버거 경쟁은 그 당시보다 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모습이다.
오는 26일 오전 11시 강남대로 일대는 파이브가이즈로 인해 긴 오픈런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공을 온전히 김 본부장의 ‘경영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